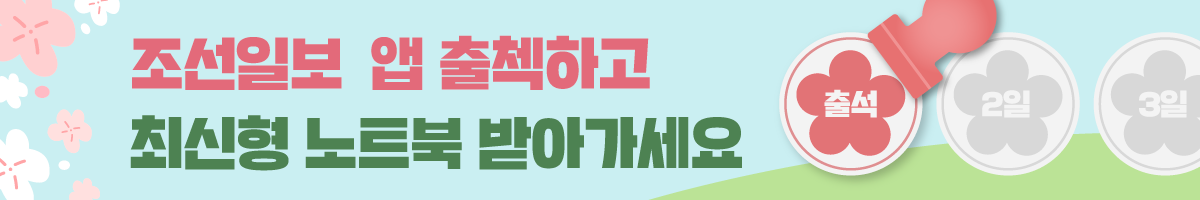확실히 젊어졌다. 대부분 동시대의 젊은 문학에 젊은 비평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예리한 비평 감각으로 문제적인 문학 현상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성찰을 시도하려는 비평적 의지와 열정들이 어지간했다. 새로운 세대 감각의 전면화는 새로운 문학의 가능성이겠다.
많은 응모작 중 비평적 스토리텔링의 수준과 시의성이 돋보인 ‘메타버스 시론: 가벼워지는 죽음 속 다시, 타락하기’, 동향과 맥락을 성찰하는 안목을 보여준 ‘신유물론적 환상성과 객체지평의 에토스’, 김혜순 시의 복합성과 중층성을 해명하고자 한 ‘¡¿명백하게 자명해지지 않기?!’, 강성은 시의 환상적 의미론을 촘촘하게 논의한 ‘’-이후’를 환상하기’ 등의 비평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숙고한 끝에 이들의 ‘이후’를 기대하기로 하고, 신해욱론과 임솔아론을 최종 후보로 남겼다.
‘원생(原生)의 에로티시즘: 신해욱론’은 생물성의 근원을 탐구하려는 신해욱의 시적 사유를 새롭게 해명하고자 한 문제의식이 인상적이었지만, 비평적 논점들의 유기적 구조화가 아쉬웠다. ‘가장 밝은 세계를 등지는 힘: 임솔아론’은 ‘바깥의 바깥’을 향한 수사학적 질문이 신선하고, 단절되거나 파열되고 고통받아 어두운 세계에 대한 징후 독법과 맥락 확장의 가능성을 보였다. 해석의 심화 여지를 유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비평적 대화성을 통해 한국문학 장을 새롭게 열어나갈 잠재력은 넉넉한 편이다. 이에 당선작으로 삼아 한국문학의 미래를 부탁하기로 한다. 각별한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이후’를 기대해도 좋을 다른 응모자들에게도 응원의 말씀을 건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