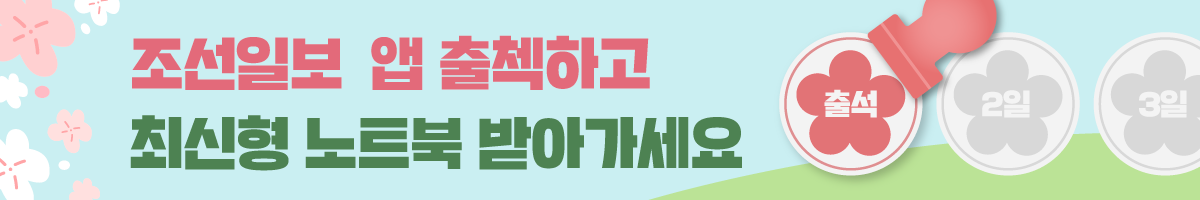요즘 스페셜티 커피에 빠졌다. 갓 내린 커피를 한 모금 음미하기 전 꼭 하는 일이 있다. 원두 산지와 수종(樹種), 재배 고도나 가공 방식이 적힌 설명문을 찬찬히 읽는 것.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를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 실제 그 지역의 향취가 느껴진다. 위스키와 와인 라벨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라벨은 일종의 품질 보증서다. 훌륭한 라벨은 그 위스키·와인만의 색깔을 또렷이 보여준다.
라벨(label)과 같은 이름을 품은 ‘음악 레이블(label)’도 마찬가지다. 훌륭한 레이블은 독창적인 색깔이 뚜렷하다. 노란색 로고로 유명한 독일 클래식 레이블 ‘도이체 그라모폰(DG)’의 음반을 집어 들면서 ‘노란 딱지에 대한 신뢰’ ‘DG만의 소릿결’ 등을 따지는 건 음악 마니아들의 즐거운 선입견이다. 미국의 유서 깊은 재즈 음반사 ‘블루노트’, 독일의 ‘ECM 레코드’처럼 그들만의 표지 디자인과 사운드로 ‘명품 브랜드’를 가진 곳들도 있다.
우리의 레이블들은 어떠한가. 최근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떠들썩한 갈등으로 업계 용어이던 ‘멀티 레이블’이 일반 대중에게도 친숙한 개념이 됐다. 우리보다 먼저 멀티 레이블을 쌓아온 해외 음반사들은 주로 다양한 장르와 음악성을 가진 레이블을 더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각 레이블이 다채로운 팔레트처럼 기능하면서 모두가 서로 건강해지는 방식이다. 하이브를 비롯한 K팝 기업들은 그간 같은 K팝 경쟁사를 인수해 몸집을 불리거나, 반대로 사내 조직을 분사하는 단순 셈법으로 멀티 레이블을 만들어 왔다.
그 결과 K팝의 멀티 레이블은 ‘합숙소’에 더 가깝다. 비슷한 음악, 비슷한 콘셉트, 비슷한 홍보로 비슷한 소비층을 공략한다. 같은 식구끼리 같은 작업장에서 서로 밀치며 경쟁한다. 음악적 스펙트럼도 오십보백보다.
이런 시스템은 재미도 없고 지속 가능성도 떨어진다. 여러 바구니의 쓰임새는 수익 극대화나 경제적 리스크 줄이기에 머문다. 설립자의 제왕적 카리스마나 고대 제국 같은 리더십은 내수의 시대였던 K팝 초기에나 통한 방식이다. 기획·제작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레이블별 개성을 장려해 총천연색을 피워내는 것이야말로 K팝 글로벌 시대의 컨트롤 타워가 해야 할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