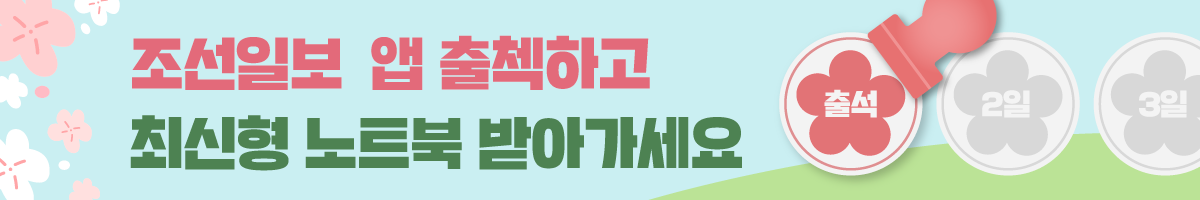누렇게 바랜 까끌까끌한 종이에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겼다. 제25대 서울시장, 제15~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을 지낸 정치 원로 이상배(85)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가정통지표 열두 통을 건넸다. 3대 독자를 끔찍이 아끼던 어머니가 이 고문의 국민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통지표를 고이 모아둔 것이다. 이 고문은 “1990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 누런 종이 뭉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해방 직후 1945년 9월 경북 상주 은척공립국민학교에 입학해 이듬해 8월까지 1학년 성적을 담은 가정통지표(1947년 작성)는 모두 한자로 돼 있다. 학교에서는 公民(공민), 國語(국어), 算數(산수), 習字(습자), 体育(체육) 등 과목을 가르쳤다. 3학년 성적이 담긴 가정통지표(1949년 작성)부터 연도가 ‘단기 4282년’으로 쓰이기 시작한다. 한자가 빼곡하던 통지표에 한글이 등장한 것도 이때부터다. 1948년 제헌국회 개회사에는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고 적혀 있다. 미 군정 시기에는 서기를 쓰다가 1948년 건국 이후 본격적으로 단기가 쓰이기 시작했다. 단기는 이후 1961년까지 쓰였다.
통지표에는 6·25전쟁의 흔적도 있다. 1~4학년 통지표에는 매달 출석 일수가 꼼꼼하게 적혀 있다. 반면 단기 4283~4284년(1950~1951년), 그가 5~6학년 때는 출석 일수가 ‘.’으로 표시됐다. 이 고문은 “전쟁 통에 출석 표시가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그의 가족은 피란을 가다가 ‘죽어도 고향에서 죽자’며 낙동강 인근에서 상주로 되돌아왔다. “남의 집 마당 한구석 ‘마답(외양간의 경북 사투리)’에서 아버지, 어머니, 누이동생들이 잠을 청하는데 소 물똥이 얼굴에 튀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쟁 중에도 학교는 다녔다고 한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성적표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1950년 약 두 달간 국민학교가 ‘인민학교’로 바뀌었던 기억도 있다”며 “’장백산 줄기줄기…' 같은 북에서 부르는 노래를 몇 곡 배웠다”고 했다. 1946년에 발표된 이 노래는 북한의 대표 군가인 ‘김일성 장군의 노래’다.
국민학교 졸업 후 경북 상주중학교를 거쳐 1955년 서울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고교 1학년 때는 광화문 한복판의 나무판자로 된 간이 건물에서 공부했다. 1961년 현 세종문화회관의 모태인 우남회관(시민회관)이 들어선 터다. 경기고는 전쟁 당시 미군 통신 부대로 쓰이다가 1956년에 반환됐다. 이 때문에 그는 고교 2학년이 돼서야 지금 정독도서관 자리에 있는 경기고 터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1958년 전교생 581명 중 4등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그해 3월 서울대 법과대에 입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