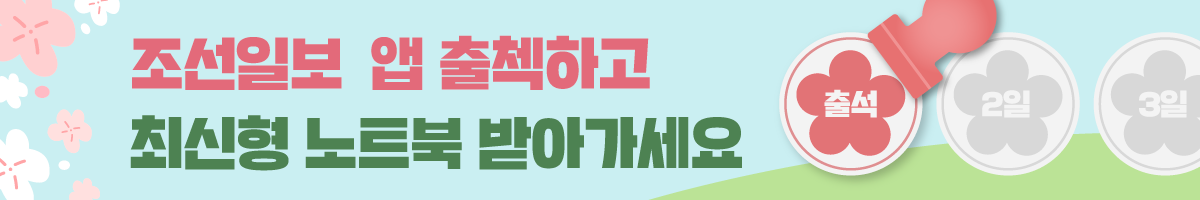파격(破格). 말 그대로 ‘격’을 파괴한다는 이 단어는 패션계에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
2018년 전 세계 K팝 팬들을 들썩이게 했던 장면이 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가 커다란 알진주 귀걸이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고 BTS 공식 트위터에 모습을 드러냈다. 요하네스 페르메이르의 유명 그림을 패러디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년’이란 설명을 달았다. ‘역시 패셔니스타’란 찬사가 쏟아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뷔니까 소화 가능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남녀 성별의 경계를 두지 않는 이른바 ‘젠더리스(genderless)’ 또는 ‘젠더플루이드(genderfluid)’ 패션은 수년 전부터 각종 패션쇼를 지배했다. 하지만 대중에게 파고들기까지는 시일이 걸렸다. 옷 잘 입기로 유명한 가수 지드래곤이나 최근 내한 공연으로 더욱 화제가 된 해외 팝가수 해리 스타일스 등이 레이스나 스커트 등 일찌감치 ‘선 넘는’ 패션에 도전하며 화제를 만들긴 했지만, 그 외에는 주로 성소수자(LGBT)를 대변하는 활동가나 도전적인 시도를 즐기는 이들이 앞장섰을 뿐이다.
최근 Z세대(1990년대 말 이후 태어나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의 경험이 적은 세대)가 전 세계 소비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주체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성중립성’ ‘성별 유동성’ 같은 요소가 이전보다 훨씬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얼마 전 서울패션위크 2023 FW 카루소 쇼에는 한복 두루마기 등에 영감받은 웨딩드레스를 남성 모델이 입고 등장했고, 청바지를 해체해 이어 붙인 긴 치마바지를 입어 젊은 층에 큰 호응을 받았다.
세계적 컨설팅 업체 맥킨지앤드컴퍼니는 “Z세대는 옷을 살 때 경제성과 포용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남녀 구분보다는 자신이 입고 싶어 하는 옷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스웨덴이나 영국 등지의 패션 브랜드나 일부 백화점에서 점차 남녀 구분을 없애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예컨대 통 큰 바지에 후드티 같은 힙합 스타일이나 스트리트 패션같이 남녀 구분 없이 입는 옷이 인기를 끌고, 여성들이 남성 재킷이나 바지를 입는 것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이를 더욱 심화시켰다.
최근엔 바지를 아예 입지 않는 식으로 ‘선 넘는’ 패션도 화제가 되고 있다. 2년 전 이탈리아 패션 하우스 프라다가 남성용 미니스커트, 이른바 ‘스코트(skort)’를 선보이며 파격을 일으킨 이후, 바지를 아예 입지 않는 ‘노팬츠’룩이 여성 패션쇼 무대를 사로잡았다.
미우미우, 로에베, 페라가모 등 해외 패션 브랜드에선 바지 길이가 ‘누가 누가 더 짧은가’를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속옷과의 경계를 허물었고, 해외 유명 모델인 카일리 제너, 벨라 하디드 등은 스타킹 위에 남성 삼각팬티나 사각 쫄팬티 같은 의상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며 시선을 끌었다. 패션지 엘르는 “민망함이 앞서지만 경제 불황으로 원단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블황룩’”이란 긍정적(?) 해석을 내놓으며 “굳이 따라 입고 싶다면 속이 비치는 원피스를 덧입으면 좋을 듯하다”고 권했다.